더스쿠프 텍스트 속 노동의 표정
20편 김성백 시인의 ‘조왕’
역사적 사건 뒤의 부엌일
먹고 떠난 자리를 치우는 손
기억되지 않는 부엌의 노동
역사는 부엌의 행간을 기록하지 않는다. 먹고 떠난 자리는 누구로 인해 아름다운가. 시인 김성백은 역사적 흔적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엌 속에서 일어나는 노동의 민낯을 들여다보자고 말한다. 당신의 부엌은 어떠한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동을 누군가 하고 있진 않은가.
![김성백 시인은 역사가 부엌의 행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낸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https://cdn.thescoop.co.kr/news/photo/202508/306931_217797_539.jpg)
2025년은 문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 서사’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시대는 분명히 아니지만, 여성 서사가 능동적으로 읽히는 시대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일례로 최근에 출간된 「제16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문학동네ㆍ2025년)」을 다룬 한겨레신문 문구를 확인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제16회 젊은 작가상 대상에 백온유 작가의 단편 ‘반의반의 반’이 뽑혔다 … 2010년 상 제정 이래 여성 작가로만 수상자가 채워진 건 올해가 네 번째다”라는 상징적인 문구가 그것이다. 따라서 동시대는 여성의 시대이자 페미니즘의 시대이며 페미니즘 이후의 시대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여성 서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비되고, 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팽배했던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의 모순이 여전히 작동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의 현상을 들여다볼 때, 여성 서사가 어떤 방식이든지 이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다고 남성 서사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에게는 여전히 발화되지 못한 짓눌린 감정이 존재하고 이 서사가 독자들에게 공감을 받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동반한 새로운 서사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읽은 1941년생 제주도 해녀의 삶을 다룬 현홍아선의 「그곳에서(In There)(한그루ㆍ2025년)」도 그렇고, 여성 노동자의 삶을 기이하고 으스스하게 재현한 박인주 작가의 「날개암(2025년)」 역시 이런 시대의 자장에서 생산된 작품이라고 평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의 작품들이 직설적인 화법으로 여성의 부조리와 소외의 흔적에 대해 형식을 변주하며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시대는 여성의 부조리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여성 텍스트가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통과하고 있으니, ‘여성’으로 표상되는 상징의 의미를 외면할 수 없다. 이는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직면해야 할 필연이다.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 통계청, 참고 | 2024년, 2019년 기준]](https://cdn.thescoop.co.kr/news/photo/202508/306931_217798_2039.jpg)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김성백 시인의 두 번째 시집 「그늘흔(걷는사람ㆍ2025년)」에서 인상 깊었던 작품 하나가 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부엌 신을 시의 제목으로 단 ‘조왕’이 그것이다.
설거지는 체념의 자세로부터 나온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해우소의 염주처럼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 남았을 때 갈릴리의 누군가는 찌꺼기를 모아 치웠고
3만 왜군에 맞선 진주성의 열혈백성 누군가는 가마솥을 헹구었고
1만 4천 명을 태우고 흥남부두를 떠나온 배 안에서도 누군가는 냄비를 닦았으리니
역사는 부엌의 행간을 기록하지 않을 뿐, 먹고 떠난 자리는 누구로 인해 아름다운가 - ‘조왕’ 부분
시인은 자신의 두 번째 시집에서 다양한 노동의 풍경을 담아 놓았다. 자유로운 인간이 아닌 부품이 되기 위해 셔틀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노동자의 삶을 그려 놓기도 하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난 다음 치아 사이에 낀 음식을 무심코 털어내는 이쑤시개를 통해, 이쑤시개의 쓸모와 노동자의 쓸모를 흥미롭게 겹쳐 놓기도 한다.
“주소 하나 얻으려고(‘주소들’)” 평생 흔들리며 살아가는 허수씨의 삶을 통해 집하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의 복잡한 감정을 응축해 녹여내기도 하고, “결혼반지(‘월말’)”를 팔아 월말 생활비를 보태 쓰는 평범한 노동자의 일상을 그리기도 한다. 수도권 주변 땅값이 금값보다 비싸진다는 것도 모르고 돈 되지 않는 동네로 이사한 것을 후회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담아 동시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한다.
시집에 담긴 이런 노동의 표정을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시인 김성백의 자기 고백과 자본주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응시는 이 시집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표정 중 하나다.
하지만 시인이 시 ‘조왕’에 특별히 눈길이 간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노동의 풍경’보다는 잘 보이지 않아 우리가 오랜 시간 인식하지 못했던 부엌의 노동을 주의 깊게 들여다봤다는 데 있다. 노동을 향한 그의 현미경적인 상상이 부엌까지 손길이 닿는 것이다.
시인은 설거지하는 행위가 ‘체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체념은 희망을 버리고 단념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주방에서 매일매일 하는 이 노동은 대가 없는 희생을 담보한다. 설거지하는 행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해우소”의 염주와 같다고 표현된 것은 반복적인 노동의 순환에서 발생하는 고됨을 의미한다. 이 감정을 풀어내지 않으면, 이 노동은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기적 중의 하나인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이 굶주림을 채웠지만, 식사 후 음식물 쓰레기를 치웠던 사람들, 조선 시대 때 적군의 침입을 방어했던 ‘진주성’에서 수많은 가마솥을 헹군 백성들, 한국전쟁 때 흥남 부두에서 피란을 떠난 후 ‘배’ 안에서 열심히 설거지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역사는 부엌의 행간을 기록하지 않을 뿐”이라고 적는다.
![[사진 | 걷는사람 제공]](https://cdn.thescoop.co.kr/news/photo/202508/306931_217799_556.jpg)
이어서 “먹고 떠난 자리는 누구로 인해 아름다운가”라는 목소리를 덧붙인다. 이 말은 부엌에서 일어났던 노동의 모습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 노동의 고마움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로도 상상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이런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기억되지 않는 부엌에서의 노동을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나아가서는 미래의 시간까지 동시에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당신의 부엌은 어떠한가. 시인 김성백은 역사적인 흔적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엌의 노동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독자들에게 이야기한다.
문종필 평론가 | 더스쿠프
ansanssunf@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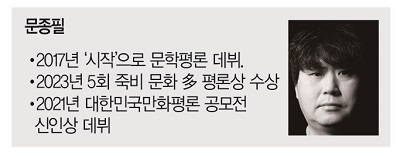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