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아트 앤 컬처
김용우의 미술思 36편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탐구정신으로 혁신 기법 사용
제자들 생각 세밀하게 담아
예수 중심으로 원근법 적용해
창밖에 원경 넣어 답답함 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1495~1498년, 젯소에 템페라, 460×880㎝,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 밀라노. [그림 | 위키백과]](https://cdn.thescoop.co.kr/news/photo/202511/308100_220608_5858.jpg)
“빈치 마을에서 온 레오나르도.”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1452~1519년)는 예술뿐만 아니라 건축과 수학, 지리, 해부학, 무기 설계 등 다방면에서 천재성을 발휘했다.
서자로 태어난 다빈치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연구하고 학습해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작품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수태고지’ ‘암굴의 성모’ 등이 있다.
다빈치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보티첼리와 함께 안드레아 델 베르키오(Andrea del Verrocchio 1435~1488년)에게 그림을 배웠는데, 스승을 능가하는 솜씨를 뽐낸 일화가 유명하다.
다빈치가 베르키오의 화실에 도제로 있을 무렵 작품 ‘그리스도의 세례(1472~1475년)’ 제작에 참여했다. 르네상스 당시에는 제자들이 작업에 동참해 그림을 함께 제작하곤 했다. 제자들은 주로 배경과 보조 그림을 맡고, 스승은 주제와 구도의 큰 방향과 중요한 디테일을 완성했다.
하지만 베르키오는 제자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제 그림은 그만 그리겠다” 하면서 조각에만 전념했다고 한다. 아마도 그림 ‘그리스도의 세례’ 왼편에 앉은 두명의 천사 부분을 보고 그런 게 아닐까 짐작해 본다. 실제로 이 작품은 베르키오 느낌보단 다빈치 분위기가 강하게 풍긴다.
다빈치의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일 듯하다. 그중 ‘최후의 만찬(1495~1497년)’을 중심으로 다빈치의 작품을 살펴보자. 이 그림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Santa Maria delle Grazie)의 수도원 식당 북쪽 벽면에 그려졌다.
당시 밀라노는 용병 출신 스포르차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가문의 일원인 루드비코 스포르차 공작이 다빈치와 브라만테를 고용해 가문의 영묘靈廟 조성 프로젝트를 맡겼다. 브라만테는 훗날 로마 바티칸 베드로 성당 재건축의 기초 설계를 맡는 건축가이기도 하다.
다빈치는 수도원 식당의 벽면 벽화 작업을 맡았다. 천재적인 과학자적 탐구 정신으로 기존 프레스코 기법이 아닌 템페라에 또다른 기법 등을 추가해 활용했다. 너무나 혁신적인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인지 완성 후 오래가지 않아 변색과 탈색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후 보완과 수정을 거쳤지만 훼손이 심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다.[※참고: 프레스코 기법은 덜 마른 회반죽에 물로 갠 안료를 칠해 벽과 일체가 되는 벽화 기법이다. 템페라는 안료를 물과 섞어 쓰는 불투명 수채화를 뜻한다.]
하지만 그림 속 인물의 심적 갈등과 성격을 담아 내기 위한 대가의 흔적은 여전히 걸작의 품위와 포스를 발휘한다. 그림의 내용은 예수가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다. 내일 일을 내다본 예수가 제자 중 배신할 사람과 거짓말할 사람을 말하고 있다.
![다빈치, 최후의 만찬(일부 수정). [그림 | 위키백과]](https://cdn.thescoop.co.kr/news/photo/202511/308100_220609_5916.jpg)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수태고지受胎告知(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잉태할 것임을 천사 가브리엘이 알린 일)와 탄생, 십자가의 달림·부활 등 함께 신앙의 핵심으로 꼽힌다.
다빈치는 인물의 특징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모델을 연구하고, 표정과 행동을 관찰했다. 인물은 3명씩 그룹지었다. 그중 왼쪽 두번째 그룹의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모른다고 거짓말한 제1대 교황 베드로다. “거짓말할 사람이 누군지 여쭤봐”라고 하면서 충격으로 쓰러지는 사도 요한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베드로는 다음날 예수를 체포하러 온 무리의 귀를 다치게 한 인물로 종종 칼을 든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 앞에 앉은 인물은 가롯 유다로, 오른손에 돈주머니를 쥔 인물로 그렸다. 이는 돈에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그리 묘사했다. 그 외에도 손가락을 치켜든 의심 많은 도마 등 다빈치는 각각 캐릭터를 연구해 인물을 표현했다.
이 작품은 예수를 중심으로 일점 투시도법에 의한 원근법이 적용되고 있다. 당시 많은 건축과 그림에서 연구하던 원근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빈치가 즐겨 사용하던 대기원근법의 한 방법인 창밖에 원경을 그려 넣는 방법을 적절히 사용했다. 답답할 수 있는 수도원 벽면에 창문을 그려넣어 공간감을 넓혀 답답함을 해소했다. 예시로 창문 닫은 그림(아래 그림)을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김용우 미술평론가 | 더스쿠프
cla030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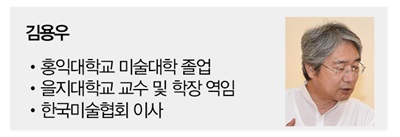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