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아트 앤 컬처
김용우의 미술思 4편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
당시 기준으론 파격적 그림
본질 향하는 새 시대 상징해
젊은 작가의 인상주의 태동
마네의 파격적인 그림들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
![에두아르트 마네 ‘풀밭 위의 점심식사’ 1863년 作. 캔버스에 유화. 208×265㎝. 오르세 미술관, 파리 프랑스. [자료 | 위키백과]](https://cdn.thescoop.co.kr/news/photo/202504/305431_214046_1430.jpg)
봄이다. 시인이자 극작가인 T.S. 엘리엇이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는 4월이다. 산과 들은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고 진달래·개나리가 지천으로 흐드러진다. 나물 캐는 처녀가 언덕으로 다니며 고운 나물 찾는다는 노래를 흥얼거리던 때가 내게도 있었다. 돌이켜 보면 더없이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그 시절 학교에서 단체로 가도 즐겁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여도 좋았던 가장 즐거운 일이 ‘소풍의 추억’이 아닐까 싶다. 소풍 이야기로 자주 회자되는 그림으론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가 있다. 1863년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매스컴과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렸고 그해 살롱전展에도 출품했지만 낙선한 작품이기도 하다.
1860년대 유럽은 혁명으로 이룬 공화국이 다시 황제의 절대군주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다. 사회 역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대변혁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다. 당시 살롱전의 성향은 고전적인 작품이 주류를 이뤘는데, 심사위원은 알렉상드르 카바넬과 같은 왕립미술학교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다비드와 앵그르 등 신고전주의 작가의 화풍을 추종하고 있었다. 쉽게 말해, 표현은 매우 사실적이고, 배경은 고대 로마이며, 주제는 애국과 나폴레옹을 신격화한 것들이었다. 르네상스 이후 서양화의 중요 표현법인 원근감·사실감·입체감도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원근감 등에서 현저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림 속 가운데 남자는 뒤에 있는데도 벌거벗은 여인에 비해 얼굴이 너무나 크다. 멀리 물가에 있는 여인의 얼굴도 앞의 남자보다 커다랗다. 그들이 타고 온 나룻배는 사람 3명이 탈 수 없을 만큼 작다.
하지만 당시 어색하고 파격적인 이 그림은 형태를 넘어 본질로 향하는 새로운 시대, 이를테면 조형의 신세계를 꿈꾸는 젊은 화가들의 실험정신, 바야흐로 펼쳐질 인상주의를 위한 태동이었다.
살롱전 출품자 중 3분의 2가 낙선한 작가 중엔 마네와 더불어 점묘화 작가로 유명한 ‘카미유 피사로’, 반항기 있는 사실주의 작가 ‘귀스타브 쿠르베’도 있었는데, 나폴레옹 3세는 이들을 위해 낙선전展을 열어줬다.
그때 관객들의 조롱과 비난의 집중포화를 맞은 작품이 바로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다. 전통적 서양미술의 조형 언어를 구사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벌거벗은 여인을 앉혀 두고 소풍을 즐기는 남자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의 내용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예술이 아닌 외설이란 비난을 자초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의 누드 그림은 쉽지 않던 사회였던지라 신神도 아닌 여성이 저렇게 벌거벗고 앉아있는 것도 모자라 부끄러움 없이 정면을 직시하고 있는 모델 빅토린 뫼랑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사람들에게 더 거슬렸을 것이다.
하지만 마네가 ‘풀밭 위의 점심식사’에서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었을 것이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부르주아들은 비도덕적 행태를 일삼고 있었다. 마네는 그런 그들에게 ‘풀밭 위의 점심식사’를 통해 “당신들 좀 제대로 살아”란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림 | 위키백과]](https://cdn.thescoop.co.kr/news/photo/202504/305431_214047_1451.jpg)
마네가 부르주아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 건 ‘풀밭 위의 점심식사’만이 아니다. 직업여성으로 보이는 여인이 누군가를 똑바로 쳐다보는 듯한 모습을 그린 ‘올랭피아’에서도 부패한 부르주아에게 일침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몇해 전 빈에 있는 성 슈테판 대성당의 계단 손잡이에 새겨진 개구리를 본 적이 있다. 끝도 없이 꼬리를 물고 오르는 무리 중 한마리는 거꾸로 내려오기도 한다. 저 높은 곳으로 오르는 개구리를 인간으로 대치해 볼 수도 있겠다 싶었다.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에도 개구리가 있다. 물론 아래쪽 무한히 낮은 바닥 왼편 끝에 있다. 그리고 저 높은 하늘엔 새도 보인다. 자유롭게 날며 천상을 노래하는 가슴이 노란 꾀꼬리. 하늘 맨 상단 중앙에 있다.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우리 사회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직도 불평과 차별은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다. 젠더문제, 인종문제, 학벌, 출신, 빈부의 문제 등으로부터 과연 우리 사회는 건강한가. 150년 전 마네의 그림 ‘풀밭 위의 점심식사’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
김용우 미술평론가 | 더스쿠프
cla030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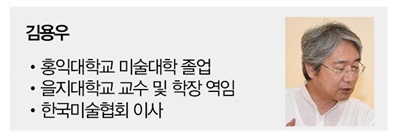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