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식의 입관
천상병
심통한 바람과 구름이었을 게다. 네 길잡이는.
고단한 이 땅에 슬슬 와서는
한다는 일이
가슴에서는 숱한 구슬.
입에서는 독한 먼지.
터지게 토해 놓고,
오늘은 별일 없다는 듯이
싸구려 관 속에
삼베옷 걸치고
또 슬슬 들어간다.
우리가 두려웠던 것은,
네 구슬이 아니라,
독한 먼지였다.
좌충우돌의 미학은
너로 말미암아 비롯하고,
드디어 끝난다.
구슬도 먼지도 못 되는
점잖은 친구들아,
이제는 당하지 않을 것이니
되레 기뻐해다오.
김관식의 가을바람 이는 이 입관을.
ㅡ『새』(조광출판사, 1971)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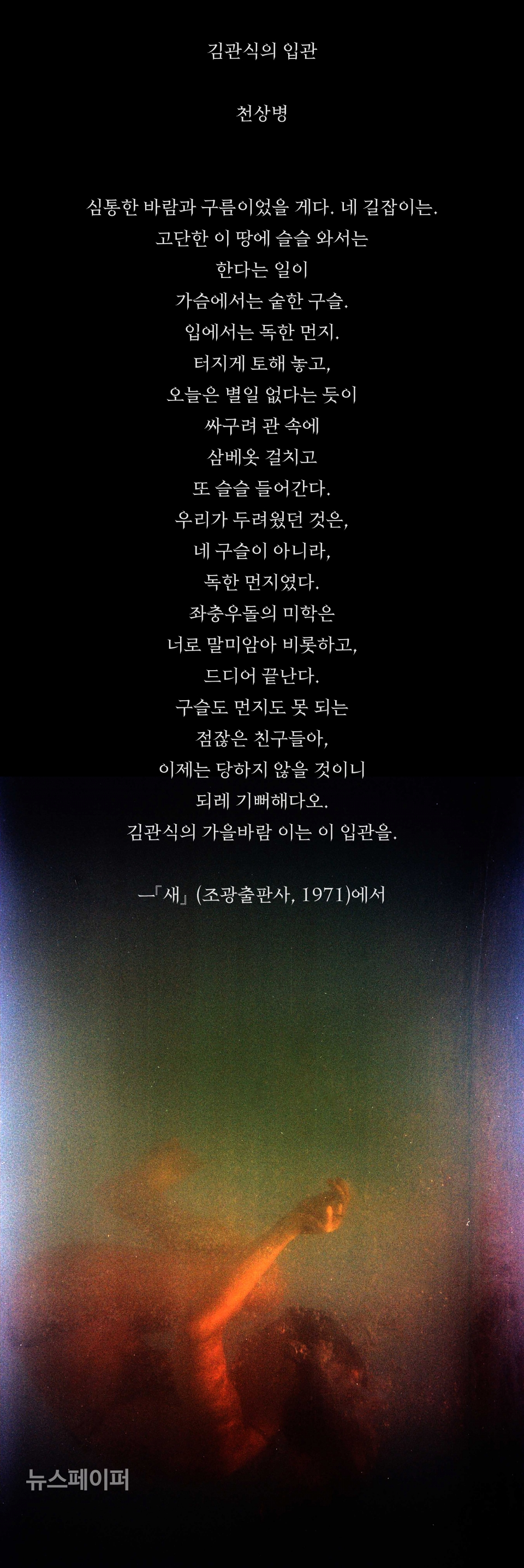
<해설>
천상병(1930〜1993) 시인이 4년 연하 김관식(1934〜1970)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읽은 조시이다. 『현대문학』 1970년 11월호에도 실렸다. 우리 문단에서 두 시인은 “좌충우돌의 미학”이란 점에서 막상막하였다. 기인으로서의 행적을 이만큼 많이 남긴 시인이 이전에는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짝을 잃은 천상병 시인은 많이 허전했을 것이다. “구슬도 먼지도 못 되는/ 점잖은 친구들”이 득시글대는 문단에서 두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몸, 더없이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두 사람에 관한 일화가 나무위키에 많이 나와 있다.
서정주 시인과 동서지간이었다. 서정주가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문인 모임에서 다른 데서 술 마시고 들어온 김관식이 “의장!” 하고 일어나 횡설수설해 회의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서정주는 주위를 둘러보며 “내가 동서 하나 둔 것이 이래서, 여러분 미안하오.”라고 사과했다. 천상병은 평소에 김관식의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하루는 그를 골탕 먹이고 술값도 벌 겸 김관식의 집에서 제법 값나가 보이는 고서 하나를 몰래 슬쩍해 봉투에 넣어 고서점에 팔아넘기려 했다. 그런데 김관식이 이를 미리 알고는 천상병이 훔친 책을 몰래 봉투에서 빼내고선 낡은 원고지 한 뭉치를 넣어버렸다. 이를 모르고 고서점에 책을 팔러 갔던 천상병은 되려 망신을 당하고 돌아와서는 적반하장으로 김관식에게 크게 화를 냈다. 김관식은 이 모습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 웃다가 기분이 좋아져 천상병에게 따로 술을 샀다고 한다.
김관식은 입으로는 독한 먼지를 뿜어내곤 했지만 가슴에는 숱한 구슬을 품고 있었다. 그의 시는 정인보ㆍ최남선ㆍ오세창 밑에서 한학을 사사한 덕에 유현한 정취를 풍긴다. 풍류가 넘치고 예지가 번뜩인다. 세상잡사에 연연하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기득권자들을 비웃다 갔다. 그와 통하는 게 있었던 천상병이 간암으로 죽은 김관식이 애통해 이 시를 썼다. 4ㆍ19혁명 이후에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산구 갑구에 출마, 당시 정계의 거물이었던 민주당 장면 후보와 맞붙었으나 낙마하고 말았다. 417표(0.99%) 득표에 꼴찌인 7위였다. 기인은 기인이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