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의 비만 Exit | 살과 사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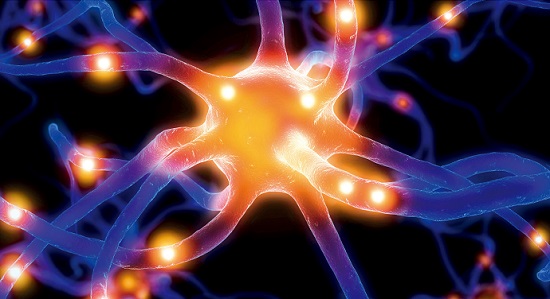
갑상샘 암의 예를 들어보자.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2008년 이후 갑상샘 암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나라(인구 비례 기준)다. 그럼 갑상샘 암은 정말 한국인에게 많을까. 인구ㆍ유전ㆍ신체적으로 한국인이 갑상샘 암에 취약하다는 요인이 없다면 그 이유를 찾다 보니 많아졌을 수도 있다. 국가별로 모집단을 구성해 검사한 결과, 한국인이 많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과 달리 외국은 일반검진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갑상샘 암의 성장 속도가 더딘 데다 환자의 생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갑상생 암만이 아니다. 실제로 암에 맞서는 의학의 발전 속도는 몹시 더디다. 그렇다면 한국인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나. 현대 의학이 과연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걸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냥 내버려둬도 별 문제 없는 것을 기필코 찾아내 수술까지 하는 건 아닐까.
유교적 도덕관을 갖고 있는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외국의 경우 자연사한 고령자를 유족의 동의 하에 부검을 한다. 그 결과, 암에 걸렸던 몸이 스스로 치유한 흔적이 사망자의 몸에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환자는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며 3년 혹은 5년을 버티는데 현대 의학은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치료받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도 사실 없다.
암을 방치한 채 소중한 생명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의 마지막 생존전략, 소위 히든 카드가 어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다. 암은 교통사고나 심근경색처럼 갑자기 다가오는 게 아니다. 최소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 좋은 책 몇권이라도 읽으며 우리 몸과 암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 우리에게 없을까. 항암ㆍ수술ㆍ방사선 등 한번 맡기면 돌이킬 수 없는 현대 의학에 우리의 몸을 덜컥 맡기는 현실, 그리고 암을 마냥 공포로 인식하는 우리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다.
박창희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hankookjoa@hanmail.net | 더스쿠프
박창희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hankookjoa@hanmail.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