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한주를 여는 시
이승하의 ‘내가 읽은 이 시를’
황정희 시인의 밥상 이야기
남의 밥상만 차리던 엄마
내 밥상 받자 쏟아진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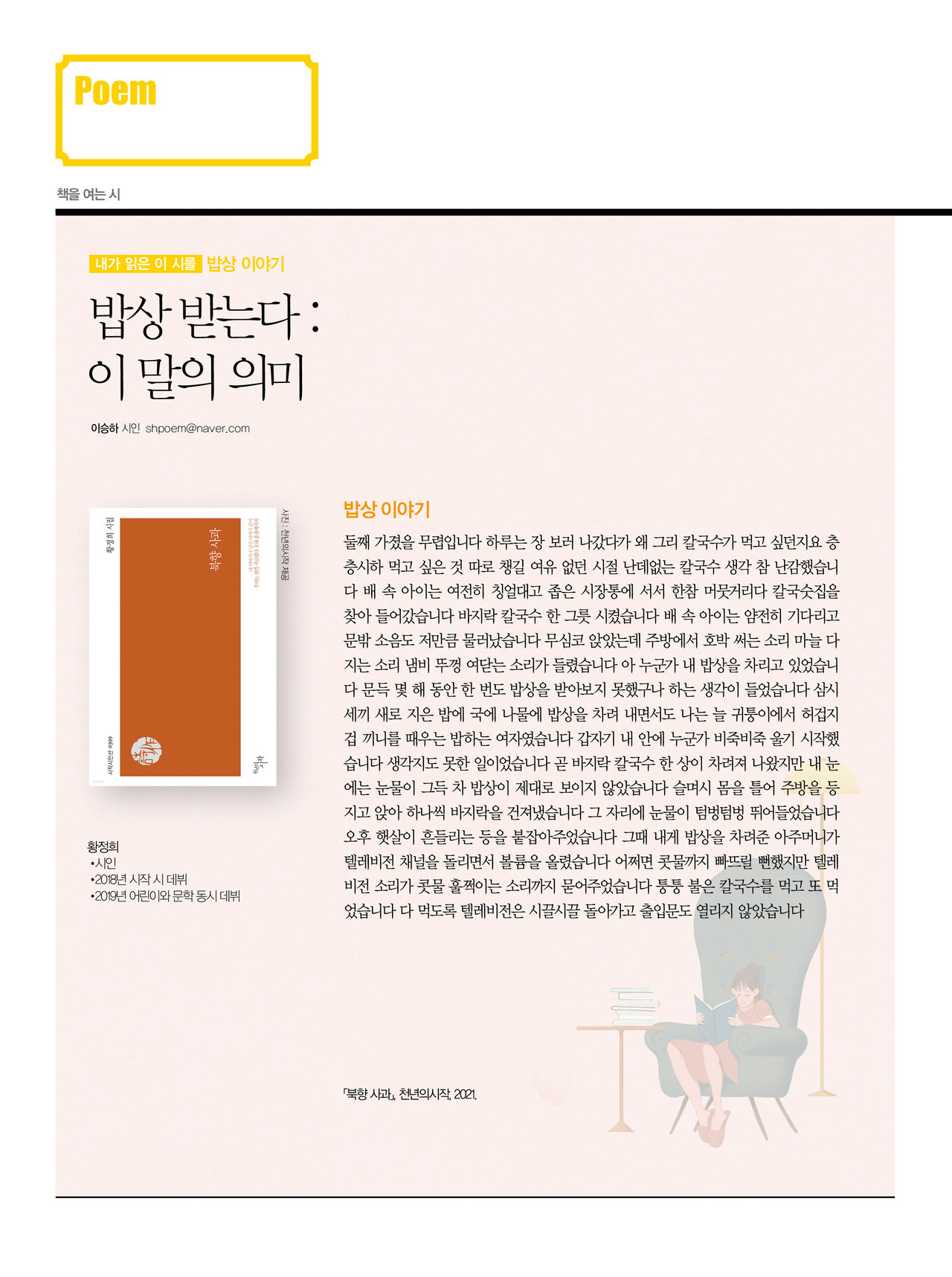
밥상 이야기
둘째 가졌을 무렵입니다 하루는 장 보러 나갔다가 왜 그리 칼국수가 먹고 싶던지요 층층시하 먹고 싶은 것 따로 챙길 여유 없던 시절 난데없는 칼국수 생각 참 난감했습니다 배 속 아이는 여전히 칭얼대고 좁은 시장통에 서서 한참 머뭇거리다 칼국숫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 시켰습니다 배 속 아이는 얌전히 기다리고 문밖 소음도 저만큼 물러났습니다 무심코 앉았는데 주방에서 호박 써는 소리 마늘 다지는 소리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누군가 내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몇 해 동안 한 번도 밥상을 받아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시 세끼 새로 지은 밥에 국에 나물에 밥상을 차려 내면서도 나는 늘 귀퉁이에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밥하는 여자였습니다 갑자기 내 안에 누군가 비죽비죽 울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곧 바지락 칼국수 한 상이 차려져 나왔지만 내 눈에는 눈물이 그득 차 밥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며시 몸을 틀어 주방을 등지고 앉아 하나씩 바지락을 건져냈습니다 그 자리에 눈물이 텀벙텀벙 뛰어들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흔들리는 등을 붙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내게 밥상을 차려준 아주머니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면서 볼륨을 올렸습니다 어쩌면 콧물까지 빠뜨릴 뻔했지만 텔레비전 소리가 콧물 훌쩍이는 소리까지 묻어주었습니다 퉁퉁 불은 칼국수를 먹고 또 먹었습니다 다 먹도록 텔레비전은 시끌시끌 돌아가고 출입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향 사과」, 천년의시작, 2021.
이 시는 상상력의 산물이 아닐 것이다. 시인 자신의 실제 체험을 쓴 거라고 생각한다. 시집가 층층시하層層侍下(부모ㆍ조부모 등의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처지) 어르신네들을 챙기기만 한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됐을 것인가.
그런데 저게 무슨 소리인가. 나를 위해 ‘밥상을 차리고 있는’ 주방장의 호박 써는 소리, 마늘 다지는 소리,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에 문득 지난 몇해 동안 한번도 밥상을 받아보지 못한 데 생각이 미쳤다. 삼시 세끼 새로 지은 밥에 국에 나물에 밥상을 차려 내면서도 자신은 늘 부엌이나 방 귀퉁이에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밥하는 여자’였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설움이 복받쳐 울기 시작한다.
식당 아주머니의 행동이 재미있다. 꺼이꺼이 우는 손님의 울음소리를 누그러뜨리려 텔레비전의 볼륨을 높인다. 손님한테 가서 말을 붙이기도 어색하고 대략 난감한 그때, 리모컨을 들고 볼륨을 높일 생각을 한 아주머니의 행동이 묘한 감동을 준다.

![[사진 | 천년의 시작 제공]](https://cdn.thescoop.co.kr/news/photo/202403/301309_203600_1835.jpg)
내 어머니는 입덧이 아주 심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평생 밥상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의 생신 때일지라도 외식을 하지 않고 가게(문방구점) 문을 열었으니 손수 미역국을 끓여 드셨을 것이다.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실감나게 쓴 시를 읽어본 적이 없다.
2022년 송수권시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한 편의 시만 봐도 타인의 마음을 뒤흔드는 시를 쓸 줄 아는 분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옥편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승하 시인
shpoem@naver.com
이민우 더스쿠프 기자
lmw@thescoop.co.kr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