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린의 ‘특별한 감정이 시가 되어’
나희덕 시인의 ‘잉여의 시간’
생명력 대신 강조하는 죽음
과거 대신 현재, 실존의 의미
부재와 잉여 차오르는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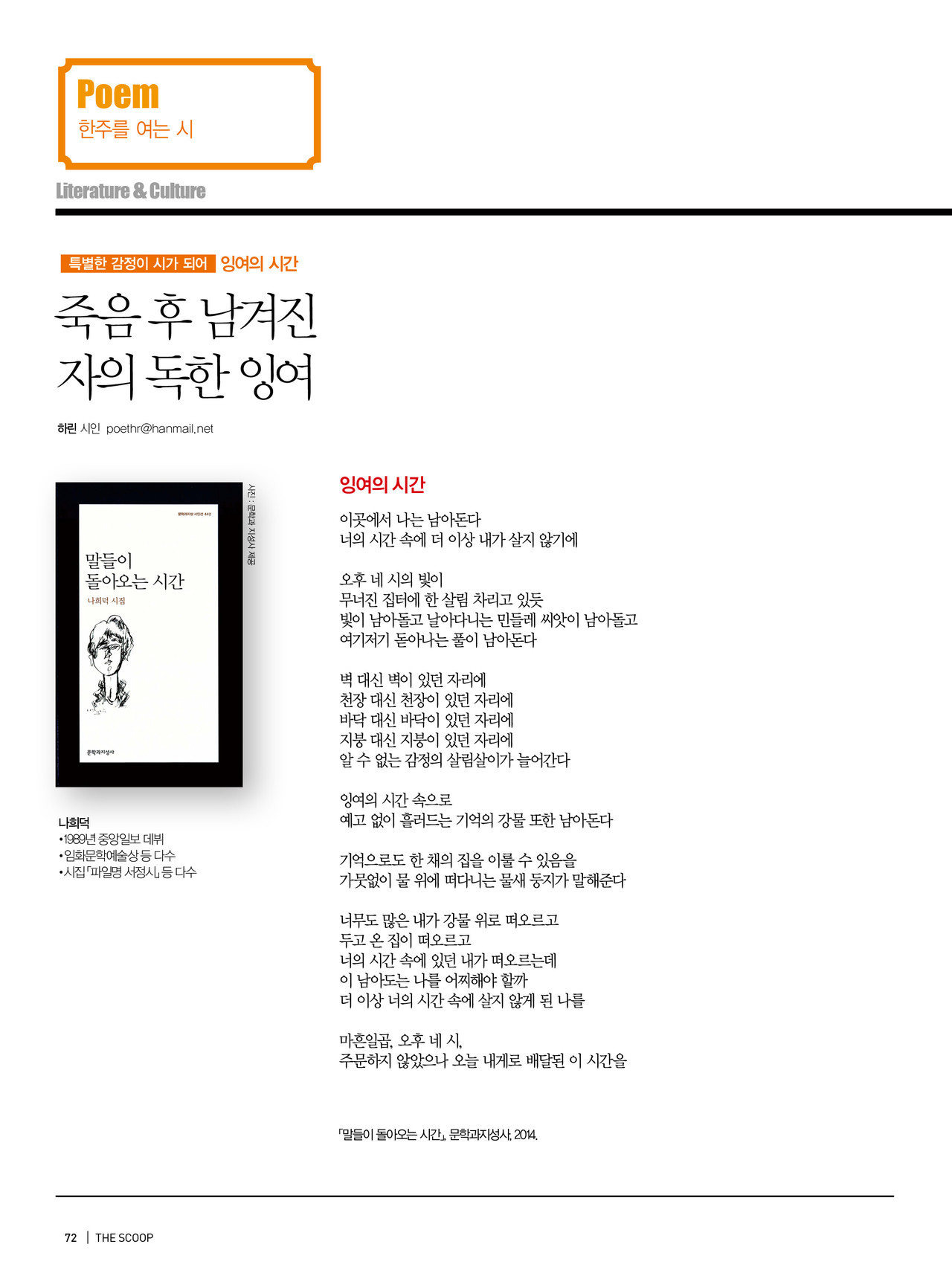
잉여의 시간
이곳에서 나는 남아돈다
너의 시간 속에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기에
오후 네 시의 빛이
무너진 집터에 한 살림 차리고 있듯
빛이 남아돌고 날아다니는 민들레 씨앗이 남아돌고
여기저기 돋아나는 풀이 남아돈다
벽 대신 벽이 있던 자리에
천장 대신 천장이 있던 자리에
바닥 대신 바닥이 있던 자리에
지붕 대신 지붕이 있던 자리에
알 수 없는 감정의 살림살이가 늘어간다
잉여의 시간 속으로
예고 없이 흘러드는 기억의 강물 또한 남아돈다
기억으로도 한 채의 집을 이룰 수 있음을
가뭇없이 물 위에 떠다니는 물새 둥지가 말해준다
너무도 많은 내가 강물 위로 떠오르고
두고 온 집이 떠오르고
너의 시간 속에 있던 내가 떠오르는데
이 남아도는 나를 어찌해야 할까
더 이상 너의 시간 속에 살지 않게 된 나를
마흔일곱, 오후 네 시,
주문하지 않았으나 오늘 내게로 배달된 이 시간을
나희덕
1989년 중앙일보 데뷔
임화문학예술상 등 다수
시집 「파일명 서정시」 등 다수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문학과지성사, 2014.
![이별은 물리적인 단절일 뿐 영원한 끝이 아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cdn.thescoop.co.kr/news/photo/202403/301227_203335_3414.jpg)
나희덕 시인은 그동안 식물적ㆍ모성적 상상력으로 생태적 치유와 화해, 긍정적인 여성성, 식물적 유연성, 사랑의 본연성, 통증과 상처의 치유 등을 시 세계에서 보여줬다. 그런데 시집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에서는 모성적 사유나 식물적 상상력을 극도로 자제한다. 그 대신 죽음의 메시지를 진중하게 부각한다. 시인에게 그러한 변화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뿌리로부터」는 그 질문을 향한 암시 내지는 해답으로 읽힌다. 주체는 “한때 나는 뿌리의 신도였지만/이제는 뿌리보다 줄기를 믿는 편이다”라고 고백하며 뿌리를 향한 신뢰를 회의한다. 그러면서 “줄기보다는 가지를/가지보다는 가지에 매달린 잎을/잎보다는 하염없이 지는 꽃을” 더 언급한다. 거대한 모성성이나 근원성보다는, 뜨겁고 치열했던 과거의 시간보다는, 현재에 주어진 상태가 갖는 의미에 비중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시인은 ‘지금-여기’ 안에서 “희박해진다는 것/언제라도 흩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더 실존임을 인식한다. 현존하는 모든 존재는 시인의 지적처럼 “뿌리로부터 부단히 도망치는 발걸음들”이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 ‘뿌리’ 대신 실체적이고 감각적인 ‘뿔’을 선호하게 된다. 이것은 ‘뿌리’의 거부가 아니다. “오늘의 일용할 잎과 꽃”을 향하는 내밀한 사유다.
뿌리의 미래는 삶이지만 잎의 미래, 꽃의 미래는 곧 죽음이다. 결국 소멸과 죽음으로 치닫는 미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의 기질이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나희덕에게서 모성적ㆍ식물적 사유는 천형天刑처럼 잔존한다.
죽음으로 인해 관계성이 제거된다고 해서 모든 연결고리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이별은 물리적인 단절일 뿐 영원한 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대상의 부재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괴로워하고 아파한다. 어떤 대상이 죽음으로써 자신을 더욱 선명히 드러낸다면 더더욱 우리는 견디기 힘든 시간들과 직면한다.
시인들이 그런 정황을 시화하는 데에는, 두 가지 암시가 따른다. 존재의 ‘부재’로 인해 생긴 큰 충격은 미학적 언어를 객관적으로 끌어오는 데 배타적이다. 그래서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격정적 태도를 갖게 된다. 반면, 부재의 충격을 온전히 받아들인 경우가 있다. 부재로 인해 생긴 아픔을 덤덤하게 그려내는 태도가 그것이다. 나희덕은 후자에 가깝다. 모성적ㆍ식물적 사유가 충격을 완화해주는 완충지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https://cdn.thescoop.co.kr/news/photo/202403/301227_203336_364.png)
「잉여의 시간」은 죽음 이후 남겨진 자에게 주어진 잉여를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의 의미로 그려낸 역설적인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감정의 노출이 조금 더 강하게 표출된다.
‘너’라는 존재가 사라진 후 ‘나’에게 주어진 잉여는 쓸모없거나 무의미한 잉여다. 시인은 그 잉여의 실체를 구체적인 형상화를 통해, 상실의 부피와 질감을 시 속에 아련하게 새겨 넣는다.
잉여의 구체적인 형상은 이렇다. “빛이 남아돌고 날아다니는 민들레 씨앗이 남아돌고/여기저기 돋아나는 풀이 남아돈다.” “벽 대신 벽이 있던 자리에/천장 대신 천장이 있던 자리에/바닥 대신 바닥이 있던 자리에/지붕 대신 지붕이 있던 자리에/알 수 없는 감정의 살림살이가 늘어간다.” ‘너’의 부재와 함께 모든 것이 허물어졌건만 그 자리에 다시 아련한 슬픔의 감정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예고 없이 흘러드는 기억의 강물 또한” 넘쳐나니, 그 위로 “너무도 많은 내가” “두고 온 집이” “너의 시간 속에 있던 내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부재는 끝이 아니라 슬픔을 극대화하는 잉여의 생산 공장이다. 감정 절제와 포용의식이 강한 나희덕 시인마저도 슬픔에 푹 젖게 만드는 아메바 같은 잉여. 시인은 그 잉여 앞에 “이 남아도는 나를 어찌해야 할까/ 더 이상 너의 시간 속에 살지 않게 된 나를” 이라고 말하며, 참고 있던 감정을 터트리고 만다.
하린 시인 | 더스쿠프
poethr@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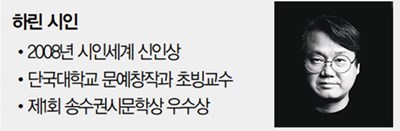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