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린의 ‘특별한 감정이 시가 되어’
조태일 시인의 국토서시
서러움을 부대끼는 운명
대범한 사랑으로 쓴 민중시
하찮음이 만드는 거대한 촛불

국토서시(國土序詩)
발바닥이 다 닳아 새 살이 돋도록 우리는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우리는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야윈 팔다리일망정 한껏 휘저어
슬픔도 기쁨도 한껏 가슴으로 맞대며 우리는
우리의 가락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버려진 땅에 돋아난 풀잎 하나에서부터
조용히 발버둥치는 돌멩이 하나에까지
이름도 없이 빈 벌판 빈 하늘에 뿌려진
저 혼에까지 저 숨결에까지 닿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 지필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숨결을 보탤 일이다.
일렁이는 피와 다 닳아진 살결과
허연 뼈까지를 통째로 보탤 일이다.
조태일
· 1941~1999년
· 1964년 경향신문 데뷔
· 만해문학상 등 다수 수상
「국토」, 창작과 비평, 1975.

1990년대 초 문청 시절 「국토서시(國土序詩)」를 처음 읽었을 때 감동은 엄청났다. 국토와 민초에 대한 시인의 대범한 애정이 거대한 산이 돼 뚜벅뚜벅 걸어와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여러 번 읽을수록 서러움이란 감정이 자꾸 도드라졌다.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의 가락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3행에서 “~수밖에 없는 일이다”의 주체인 ‘우리’가 꼭 가난하게 사는 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에 젖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서러워도 국토와 부대끼며 국토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래서 더욱 서러움은 뜨거웠다. 그러니 이 시에 나타난 ‘우리’는 우리라는 대명사가 아니라, 서러움을 갖고 있는 특별한 민초들을 지칭하는 새로운 ‘고유명사’다.
1970년대 중반 폭압적인 정치적ㆍ사회적 상황에서 보면 이 시는 참여시다. 그러나 개인의 정서적 입장에서 보면 민중시다. 구체적인 민중의 생존 현장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피지배층의 감정이 자발적으로 발현된다.
다시 한번 ‘고유명사’인 ‘우리’에게 주목해보자. “발바닥이 다 닳아 새 살이 돋도록”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이라는 구절에서 ‘발바닥’과 ‘숨결’은 가식 없는 상태의 그 자체다. 그런 ‘온몸’적인 상징체를 소유한 사람들은 민중적인 서러움을 실감하는 ‘우리’밖에 없다. 가진 것 없는 존재들은 온몸 자체가 내용이고 형식이기에 ‘야윈 팔다리’ 또한 서러움을 가진 민중들을 암시한다.
조태일 시인은 결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첨예한 거시 담론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버려진 땅에 돋아난 풀잎 하나에서부터/조용히 발버둥치는 돌멩이 하나에까지”라고 말하며 ‘풀잎 하나’ ‘발버둥치는 돌멩이’를 ‘우리’의 몸짓으로 표출했다. 가진 자에게 풀잎 하나와 돌멩이 하나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그것들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생로병사를 함께하고 낮은 곳을 견디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풀잎 하나와 돌멩이 하나라도 “일렁이는 피와 다 닳아진 살결과/허연 뼈까지를 통째로” 보탠다면 거대한 촛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온몸으로 국토를 사랑하는 국토 자체가 돼 “이름도 없이 빈 벌판 빈 하늘에 뿌려진” 먼저 죽어간, ‘혼에까지’ ‘숨결에까지’ 끝내 닿고 마는 혁명을 맞이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cdn.thescoop.co.kr/news/photo/202401/300666_201858_513.jpg)
지금이 1970~1980년대보다 더 살기 좋아졌다고, 더 나아진 민주화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참여시, 민중시, 노동시의 소중함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다.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계열의 시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 당시 그 계열 속에 있던 시들은 분명 형식적 측면에서는 미학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크고 대담하게 시대성을 반영한 용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비겁하게 미학성만 찾던 사람들은 권력에 아부하거나 방관자적 태도만을 보였다. 인간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되새겨져야만 한다. 그래야 국민의 대다수인 ‘우리’가 더 이상 핍박받지 않게 되는, 진짜 정의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국토’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참여시, 민중시, 노동시 계열 중에서도 작품성이 확보된 좋은 작품을 가려내어 읽고 노래하면서 거기에 서린 정서를 풍부하게 공감해야 한다. 그렇다고 작품을 쓴 작가를 무작정 찬양하자는 말은 아니다. 텍스트 안에 서린 주제 의식과 미학적으로 자리한 형식적 요소를 연구한 후 보급해서 작품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를 분명하게 하자는 말이다.
서러움은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자주 만나는 감정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러움이 증폭하지 않도록, 서러움이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강인한 ‘우리’가 돼 “우리의 가락 속을” 덩실덩실 춤을 추며 거닐 수 있는 역설적인 몸짓을 가져야 한다. ‘서러움’마저 숭고미로 승화해 풀어내는 승무를 추는 여승들처럼, 해학미로 불합리한 사회를 비꼬면서 관통했던 탈춤 속 ‘말뚝이’처럼….
하린 시인 | 더스쿠프
poethr@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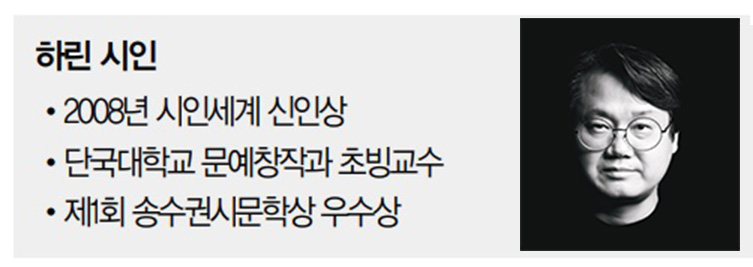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